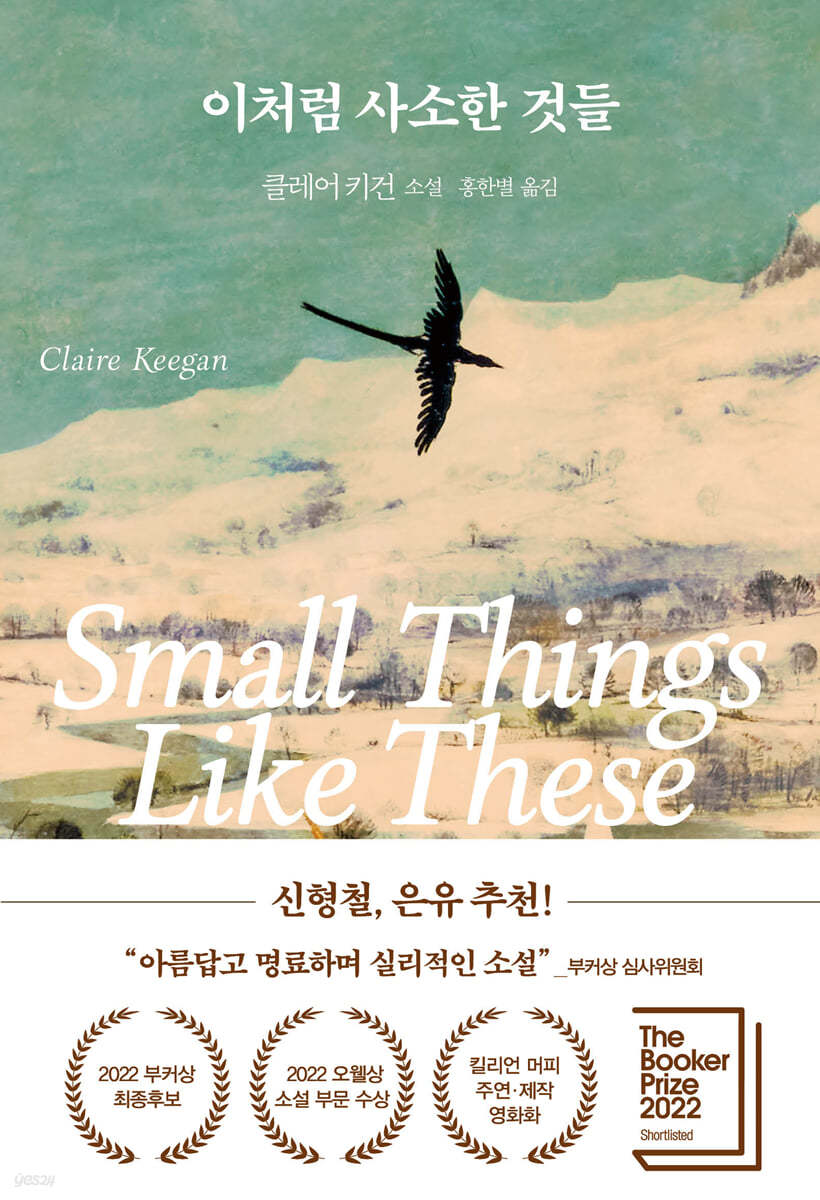링또
@ring_ddo
+ 팔로우


251219
이 책은 주인공의 일상을 따라가는 이야기다.
크게 도파민을 자극하지도 않고 어찌 보면 단조롭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날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 책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생각을 하게 만든다.
『혹독한 시기였지만 그럴수록 펄롱은 계속 버티고 조용 히 엎드려 지내면서 사람들과 척지지 않고, 딸들이 잘 커서 이 도시에서 유일하게 괜찮은 여학교인 세인트마거릿 학 교를 무사히 졸업하도록 뒷바라지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펄롱은 그러지 않았다.
사소해 보이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것.
그의 선택은 조용했지만 그만큼 많은 용기가 필요했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알고 있으면서도 나한테까지 피해가 오지 않길 바라며 묵인해 버리는 일들이 있다.
목소리를 낸다는 것,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용감하고 위대한 일인지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곧 펄롱은 정신을 다잡고는 한번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정리했다. 각자에게 나날과 기회가 주어지고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라고. 게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간 날들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게, 비록 기분이 심란해지기는 해도 다행이 아닌가 싶었다. 날마다 되풀이되는 일과를 머릿속으로 돌려보고 실제로 닥칠지 아닐지 모르는 문제를 고민하느니 보다는.』
아직 닥치지 않은 일들에 대해 괜히 앞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나에게 이 문장은 유독 깊이 다가왔다.
이미 지나온 하루하루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충분히 다행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 이 책을 두 번은 읽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그 말에 충분히 공감한다.
다시 읽고 나서 다시 첫 장으로 돌아왔을 때 이 그들은 더 깊게 와닿을 것이다.
나 또한 그렇고.
영화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있었다!
꼭 봐야지👻
이 책은 주인공의 일상을 따라가는 이야기다.
크게 도파민을 자극하지도 않고 어찌 보면 단조롭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날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 책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생각을 하게 만든다.
『혹독한 시기였지만 그럴수록 펄롱은 계속 버티고 조용 히 엎드려 지내면서 사람들과 척지지 않고, 딸들이 잘 커서 이 도시에서 유일하게 괜찮은 여학교인 세인트마거릿 학 교를 무사히 졸업하도록 뒷바라지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펄롱은 그러지 않았다.
사소해 보이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것.
그의 선택은 조용했지만 그만큼 많은 용기가 필요했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알고 있으면서도 나한테까지 피해가 오지 않길 바라며 묵인해 버리는 일들이 있다.
목소리를 낸다는 것,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용감하고 위대한 일인지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곧 펄롱은 정신을 다잡고는 한번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정리했다. 각자에게 나날과 기회가 주어지고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라고. 게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간 날들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게, 비록 기분이 심란해지기는 해도 다행이 아닌가 싶었다. 날마다 되풀이되는 일과를 머릿속으로 돌려보고 실제로 닥칠지 아닐지 모르는 문제를 고민하느니 보다는.』
아직 닥치지 않은 일들에 대해 괜히 앞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나에게 이 문장은 유독 깊이 다가왔다.
이미 지나온 하루하루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충분히 다행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 이 책을 두 번은 읽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그 말에 충분히 공감한다.
다시 읽고 나서 다시 첫 장으로 돌아왔을 때 이 그들은 더 깊게 와닿을 것이다.
나 또한 그렇고.
영화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있었다!
꼭 봐야지👻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1개월 전
 0
0
 0
0
링또님의 다른 게시물

링또
@ring_ddo
250718
오랜만에, 나의 생각을 전환시켜 준 고마운 책을 만났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삶을 원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나에게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책이었다.
같은 상황에서도 작가는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나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며 아무 감정 없이 하루를 보내거나,
때론 고립되고 우울한 감정 속에 스스로를 가둬두고 있었던 것 같다.
스스로도 그런 점을 잘 알고 있었고,
그 감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계속 애써왔다.
하지만 그게 잘되지 않았을 뿐.
그런데 정말 마법처럼, 이 책을 읽고 나서 갑자기 에너지가 생겼다.
“그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그거, 잘못하는 거 아니야.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그냥, 지금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지내고 싶다.”
항상 하는 생각이고, 누구도 그런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편한 감정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고,
정말 신기하게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죄책감이 사라졌고, 기분이 좋아졌다.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그렇게 된 건 사실이다.
책 속에는 작가가 그 당시에 들었던 노래들이 함께 소개되는데,
그 노래들을 들으며 책을 읽으니, 책이 한층 더 풍부해지는 느낌이었다.
그것 또한 너무 좋았다.
그냥,
지금 이 시기의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건,
럭키.
친구가 스토리에 이 책을 올렸고,
그 책이 뭔지 내가 물어봤던 것도,
럭키.
모든 게 럭키.
그렇게 될 거였나 보지, 뭐.
오랜만에, 나의 생각을 전환시켜 준 고마운 책을 만났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삶을 원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나에게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책이었다.
같은 상황에서도 작가는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나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며 아무 감정 없이 하루를 보내거나,
때론 고립되고 우울한 감정 속에 스스로를 가둬두고 있었던 것 같다.
스스로도 그런 점을 잘 알고 있었고,
그 감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계속 애써왔다.
하지만 그게 잘되지 않았을 뿐.
그런데 정말 마법처럼, 이 책을 읽고 나서 갑자기 에너지가 생겼다.
“그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그거, 잘못하는 거 아니야.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그냥, 지금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지내고 싶다.”
항상 하는 생각이고, 누구도 그런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편한 감정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고,
정말 신기하게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죄책감이 사라졌고, 기분이 좋아졌다.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그렇게 된 건 사실이다.
책 속에는 작가가 그 당시에 들었던 노래들이 함께 소개되는데,
그 노래들을 들으며 책을 읽으니, 책이 한층 더 풍부해지는 느낌이었다.
그것 또한 너무 좋았다.
그냥,
지금 이 시기의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건,
럭키.
친구가 스토리에 이 책을 올렸고,
그 책이 뭔지 내가 물어봤던 것도,
럭키.
모든 게 럭키.
그렇게 될 거였나 보지, 뭐.

취향껏 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1개월 전
 0
0
 0
0

링또
@ring_ddo
250720
오디오북으로 들었다.
친구의 추천으로 접한 책이라, 책 제목만 보고 인문학 책인 줄 알았는데 소설이었다.
초반부터 죽은 연인의 살을 먹는다는 내용이 나와 살짝 거부감이 들었고,
그 정도로 얽힌 구와 담의 관계도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구와 담의 서사가 차츰 풀리면서 몰입도가 점점 깊어졌다.
다 듣고 난 뒤에도, 왜 담은 구를 먹었는지에 대한 답은 어렴풋이 와닿을 뿐, 여전히 명확히 이해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어른으로서 바라보는 주인공들의 삶이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
이것을 과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들은 어렸고, 세상은 그들을 고립시켰고, 그 속에서 그들에게는 그것이 사랑이었을지도 모른다.
조금 괴이하게 느껴지는 문장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글이 하나하나 다 너무 예뻤다.
글이 예쁘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다 주옥같아서 듣는 내내 마음을 울렸다.
많은 여운이 남는 책이다.
나도 함께 마음이 가라앉는다.
다음 책은 분위기 전환을 위해 조금은 밝은 책으로 골라야겠다.
오디오북으로 들었다.
친구의 추천으로 접한 책이라, 책 제목만 보고 인문학 책인 줄 알았는데 소설이었다.
초반부터 죽은 연인의 살을 먹는다는 내용이 나와 살짝 거부감이 들었고,
그 정도로 얽힌 구와 담의 관계도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구와 담의 서사가 차츰 풀리면서 몰입도가 점점 깊어졌다.
다 듣고 난 뒤에도, 왜 담은 구를 먹었는지에 대한 답은 어렴풋이 와닿을 뿐, 여전히 명확히 이해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어른으로서 바라보는 주인공들의 삶이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
이것을 과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들은 어렸고, 세상은 그들을 고립시켰고, 그 속에서 그들에게는 그것이 사랑이었을지도 모른다.
조금 괴이하게 느껴지는 문장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글이 하나하나 다 너무 예뻤다.
글이 예쁘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다 주옥같아서 듣는 내내 마음을 울렸다.
많은 여운이 남는 책이다.
나도 함께 마음이 가라앉는다.
다음 책은 분위기 전환을 위해 조금은 밝은 책으로 골라야겠다.

구의 증명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1개월 전
 0
0
 0
0

링또
@ring_ddo
250721
문가영이라는 배우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싶었다.
1부 ‘존재의 기록’은 개인적으로 어렵게 다가왔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었고, 그래서 읽는 데도 시간이 꽤 걸렸다.
한편으로는 솔직하게 쓰지 못하고, 나만 알아볼 수 있게 글을 쓰는 내 모습이 떠올랐다.
혹시 문가영 배우도 그런 마음이었을까? 생각하니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았다.
2부 ‘생각의 기록’은 조금 더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앞보다 가볍게 읽을 수 있었다.
책을 읽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떠올랐고, 나는 GPT에게 물어봤다.
“산문집이 뭐야?”
대답 중에 가장 놀라웠던 건,
‘작가가 독자의 공감이나 반응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글의 형태.’라는 것이다.
나는 다시 질문했다.
“박정민 배우의 『쓸만한 인간』은 직관적으로 와닿았는데,
『파타』는 문가영 배우가 무슨 생각으로 썼는지 잘 와닿지 않아서 자꾸 생각이 많아져.”
GPT는 곧바로 정리해주었다.
『쓸만한 인간』은 감정을 말로 번역해 설명해주는 책이라고 했다.
그래서 위로받고, 동의하고, 웃고 울 수 있었고, 내게도 쉽게 와닿았던 거라고.
반면 『파타』는 언어를 감정 그 자체로 쓰는 책이라고 했다.
읽으면서 “이 감정, 나도 느껴봤던가?” 하고 내 안을 들여다보게 되는 책이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머리가 맑아졌다.
아, 굳이 모든 걸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파타는 나에게 해석되지 않아도 괜찮은 책이야.
책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느낀 걸로 충분한 책.
파타는 나에게 그런 책이다.
책 마지막 뒷표지에는 김이나 작사가가 쓴 글이 적혀 있다.
『아무에게도 걱정을 끼치지 않는, 고요한 아픔의
시간으로 성장한 이들은 위로의 대상에서 제외되곤 한다.
그런 아픔은 드러나지 않아 외롭고, 목격자가 없어
나만의 기록으로 남는다. 문가영의 이야기는 그런 이들이
처음 만나는 공감과 위로가 될 것이다.』
파타라는 책을 너무 잘 이해하고 설명해 준 글 같다.
문가영이라는 배우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싶었다.
1부 ‘존재의 기록’은 개인적으로 어렵게 다가왔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었고, 그래서 읽는 데도 시간이 꽤 걸렸다.
한편으로는 솔직하게 쓰지 못하고, 나만 알아볼 수 있게 글을 쓰는 내 모습이 떠올랐다.
혹시 문가영 배우도 그런 마음이었을까? 생각하니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았다.
2부 ‘생각의 기록’은 조금 더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앞보다 가볍게 읽을 수 있었다.
책을 읽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떠올랐고, 나는 GPT에게 물어봤다.
“산문집이 뭐야?”
대답 중에 가장 놀라웠던 건,
‘작가가 독자의 공감이나 반응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글의 형태.’라는 것이다.
나는 다시 질문했다.
“박정민 배우의 『쓸만한 인간』은 직관적으로 와닿았는데,
『파타』는 문가영 배우가 무슨 생각으로 썼는지 잘 와닿지 않아서 자꾸 생각이 많아져.”
GPT는 곧바로 정리해주었다.
『쓸만한 인간』은 감정을 말로 번역해 설명해주는 책이라고 했다.
그래서 위로받고, 동의하고, 웃고 울 수 있었고, 내게도 쉽게 와닿았던 거라고.
반면 『파타』는 언어를 감정 그 자체로 쓰는 책이라고 했다.
읽으면서 “이 감정, 나도 느껴봤던가?” 하고 내 안을 들여다보게 되는 책이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머리가 맑아졌다.
아, 굳이 모든 걸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파타는 나에게 해석되지 않아도 괜찮은 책이야.
책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느낀 걸로 충분한 책.
파타는 나에게 그런 책이다.
책 마지막 뒷표지에는 김이나 작사가가 쓴 글이 적혀 있다.
『아무에게도 걱정을 끼치지 않는, 고요한 아픔의
시간으로 성장한 이들은 위로의 대상에서 제외되곤 한다.
그런 아픔은 드러나지 않아 외롭고, 목격자가 없어
나만의 기록으로 남는다. 문가영의 이야기는 그런 이들이
처음 만나는 공감과 위로가 될 것이다.』
파타라는 책을 너무 잘 이해하고 설명해 준 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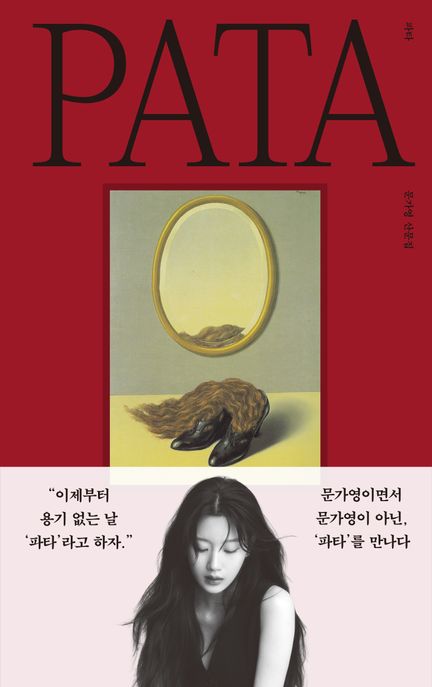
파타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1개월 전
 0
0
 0
0
게시물 더보기
웹으로 보기